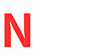70,80년대 드라마와 영화 단골소재는 멜로와 치정, 복수극이었다. 고전으로 갈수록 남녀 간의 복잡하게 얽힌 치정의 갈등은 제3의 인물 등장으로 복수로 치닫고 숨 막히는 극적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결말은 살인으로 종결되거나 한 여자의 운명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 이였다 뻔한 결말을 알면서도 이야기의 종착 지점까지 시청자와 관객들은 선(善)한 인물로 분한 극중 인물과 동일화되어 분노와 감정을 쏟아내며 극과 밀월을 즐기게 된다. 결말을 알면서도 유교적인 문화가 배어있는 사회에서 불륜·치정·복수는 그만큼 악인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요즘 복수의 반전은 과거와 현재, 비현실의 시공간을 초월적으로 넘나드는 소재로 넘쳐나고 드라마보다 더한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뉴스의 홍수에도 불멸의 소재는 남녀 간의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일 것이다.
작가가 위대해지는 순간은 드라마를 단순한 이야기로 만들지 않는 상상력에 있다. 여기에 재미·감동·서스펜스와 극적인 긴장감이 더해지면 극은 살아나고 배우들의 연기로 플롯은 현실처럼 느껴지게 되고 연극을 보는 현장감 있는 재미에 절정을 이루게 된다. 보너스로 드라마와 연극 즐기기의 맛은 오감의 정점을 향하게 된다. 섬뜩한 복수의 욕망으로 둘러싸여 반전을 거듭하며 기막힌 한 인간의 운명과 복수의 업을 다루면서 소극장에서 3시간에 걸쳐 관객 시선을 고정하는 작품이 있다. 단순한 플롯에 가족사가 더해지고 2,3대에 걸친 운명적인 복수의 종착역을 한 가족의 업보(業報)로 만든다. 아들은 죽고 대를 잇는 손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예기치 못한 운명을 가진 한 중국집안의 이야기에 에로티시즘적인 욕망과 멜로, 신분의 문제, 섬뜩한 복수의 욕망으로 둘러싸여 반전을 거듭하는 연극이다.
연극 애호가나 일반관객들은 ‘뇌우’로 국내 연극무대에서도 알려진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 조우 원작 ‘원야’의 이야기를 각색한 극단 인어 최원석 연출의 ‘살·색(殺·色)’(대학로 아름다운극장)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그동안 ‘변태’ ‘불멸의 여자’ ‘빌미’ ‘화로’ 등 현대적인 연극 문법으로 작가적 희곡 쓰기와 감각적인 연출로 한국 사회의 권력의 환부와 부조리의 민낯들을 양식적인 연극언어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던 최원석은 2022 가을 ‘인어(人語)의 향연 시리즈’ 1탄 해롤드 핀터의 ‘생일만찬’ 에 이어 두 번째 연극으로 기획된 작품인데 이번 무대가 특별한 점은 인간과 삶의 부조리한 현상을 다루고 있는 원작 희곡 ‘생일파티’는 현대극에서도 고전이 되고 있는 작품이고 원작 중국희곡 ‘초야’를 각색해 무대화하고 있는 이번 작품 ‘살·색’도 1936년에 발표한 작품인데도 해석과 무대구성은 현대적이다.
최원석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연극무대가 초현실적인 무대나, 코로나19로 연극과 영상 드라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 시대에 아마도 연극적인 전통성과 연극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아날로그 연극 정신으로 희곡작가와 연극연출자로 무대를 향한 전투태세를 보인다. 무대 기술이 연극의 플롯을 압도하고, 연출적인 상상력이 멀티미디어화 되어가는 요즘 연극방식에 연극무대의 전통성을 회복해 관객과 정면승부를 해보려는 도전적인 자세가 보이면서도 무대로 돌아온 고전 두 편의 연극적인 기대감을 실망시키지 않는 승부사적 기질을 보인다.
연극 ‘살·색’의 이야기는 마 씨 가문과 장강 가문을 중심으로 대(代)를 이은 비극적 운명과 업보에 관한 이야기다. 춘희를 사랑한 장강은 마을에 지주인 양아버지로 모신 동생 마대성의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빼앗기고 여동생은 창녀로 팔려 간다. 아버지는 잔혹한 죽임을 당하고 장강은 두 다리에 족쇄가 묶여 감옥에서 10년 세월을 보내게 된다. 장강과 사랑한 춘희(윤재진 분)는 마대성의 첩으로 노예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극이 흥미로워지는 것은 여기에 극중 인물 춘희를 둘러싸고 마대성(지근우 분)과 장강(윤상호 분)의 삼각 관계적인 질긴 애정과 사랑이 더해지고 매력적인 춘희의 에로티즘적인 뜨거운 내면 욕망이 섞여진다.
비극적인 운명을 직감한 마대성의 모친 왕염(송예리 분)은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문을 지키기 위해 복수의 업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 비극적 운명은 마 씨 가문의 대를 잇는 마대성의 아이를 향해 치닫게 되고 가문의 업은 비로소 죽음으로 몰락하고 운명의 저주로 왕염이 앞을 못 보는 신세가 된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연극은 대가 끊겨야 하는 장강의 쇠사슬처럼 질긴 업을 끊어 낼 수 있는 왕염과 마 씨 가문의 비극적 운명을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장면으로 왕염은 기구한 운명을 보인다. 장강을 향해 내려친 섬뜩한 도끼의 핏물은 아이의 죽음으로 돌아오고 장강은 춘희를 통해 권총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왕염과 마씨 가문의 업보는 인간의 에로티즘적인 욕망과 사랑도 한 인간의 기구한 숙명과 운명 앞에서는 저주의 비극으로 그 생명이 살육의 전쟁터가 되고 죽음의 파멸로 가문의 업은 비로소 질긴 쇠사슬의 업을 끊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장강이 탈옥해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연극 ‘살·색’은 마치 동화 속 기찻길 옆 마을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된다. 마 씨 가문의 업의 시간여행을 우보(박현욱 분)로 부터 악의 인연이 과거로부터 떠나듯 시작된다.
무대공간은 소극장 무대인데도 대나무 숲으로 공간을 개방적으로 배치하고 최원석 특유의 양식화된 연극적 장면들이 긴장감 있게 무대로 배치된다. 춘희를 중심으로 도발적인 에로틱한 장면들을 연출하면서도 마 씨 가문의 비극적인 서사를 양식적인 극적 구조들과 조우의 사실주의 장면들로 연출 언어를 배합하면서도 배우들의 밀도 있는 연기와 긴장감 있는 앙상블을 이루며 이례적으로 소극장 무대에서 3시간을 흥미롭게 무대를 구현하고 지켜내는 것을 보면, 최원석 연출은 연극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80%는 성공한 것 같다. 특히 무거운 서사의 틈에서도 긴장과 이완으로 극의 균형을 잡으며 웃음을 형성하는 박현욱과 윤재진의 광기 적인 욕망의 연기, 노파의 비극적인 운명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송예리와 윤상호의 내면성, 지근우의 연기의 정직함이 최원석의 시선을 따라가면서도 원작 희곡의 경계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만큼 극단 인어 최원석 연출의 시선이 중국 고전의 맛을 정직하면서도 파격적으로 무대로 그려내고 있다. 중국 고전과 현대적인 연극 감각을 이해하고 싶은 관객이라면 추천하는 연극이다. 주말에는 조우의 중국 고전을 최원석의 현대적인 각색으로 공연되고 있는 연극 한 편이 어떨까.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