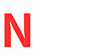요즘 보수 언론 조선·중앙·동아일보 지면이 바뀌었다고 많은 이가 말한다. 특히 조선일보의 변화가 뚜렷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정치 기사는 물론 특히 오피니언 페이지에서 전과 다른 논조가 쏟아진다.
이게 뭘까. 윤통 석방 이후 탄핵 기각이 유력해지자 여기에 영합하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분명 기회주의적 처신이며, 양다리 작전이니 우리가 원하는 언론개혁엔 못 미친다.
그럼에도 이게 어디냐 싶다. 당장 코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조짐이다. 지면을 들여다보자. 무엇보다 눈치 빠른 조선일보의 지면 변화가 돋보이는데, 지난 수요일인 3월12일자 사설은 정치적 악마에 다름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본격적으로 때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농간을 정조준한 것으로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다. ‘3년간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
조선일보는 민주당발(發) 사기 탄핵의 공범이 아니던가. 미쳐 돌아가던 그 신문에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걸 묻지 않을 수 없는 지면이다. 실은 그 하루 전인 3월11일자 3면의 경우 그동안 논란이었던 윤통 내란죄 관련한 불법수사·부실수사를 도마에 올리며 지면 변화의 추세를 재확인시켜 줬다.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하지만 조선일보 변신의 하이라이트는 3월14일 1면 머리기사로, ‘야(野) 탄핵안 8전8패…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며 이재명을 대놓고 겨냥한 점이다. 실은 이런 흐름은 윤통의 석방 이후 뚜렷하다. 단 변화의 조짐은 2030 세대의 반탄 분위기가 뚜렷하던 2월부터 엿보였다. 이를테면 2월11일자 조선일보는 10·11면에 걸쳐 자유대학연대 소속 젊은이들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어쨌거나 12.3계엄 직후 윤통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던 조·중·동의 분위기에선 꿈도 못 꾸었을 지면 변화다. 이 와중에 조·중·동 세 신문 사이의 편차도 드러난다. 눈치 빠른 조선일보가 앞장서자 중앙·동아가 부분적으로 합류하는 양상이다. 그중 중앙일보의 경우 사주 홍석현의 한계 때문에 지면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굼뜨다. 명색만 보수이지 실제로는 좌익 영합 신문이다.
그런 중앙일보의 한계는 오래전부터 대통령병 환자인 홍석현의 싱크탱크인 여시재의 영향으로, 이것은 친중 행보를 거듭해 온 지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미 망가진 중앙일보는 못난 오너 홍석현의 사주 리스크에 발목 잡혔다면, 나름 전통있는 동아일보 추락의 이유는 또 다르다. 아시는가. 그 신문은 조·중·동의 한겨레로 불릴 정도로 좌편향이 심하다.
실제로 그 신문은 초라한 ‘호남 신문’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그 신문사엔 호남 출신들이 득시글댄다.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가 호남이 기반이었기 때문일 텐데, 사정을 알고 보면 더 가소롭다. 즉 인촌 김성수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고, 지금의 호남 정서와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지금 동아일보는 인촌 김성수의 본질을 버리고 좌파 정치인 김대중과 한 몸이 됐다.
좀 다르게 말할까. 동아일보는 1950년대 반(反)이승만·반독재의 전통 속에 야당지 이미지를 구축했으나 그걸 1980·9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깃발과 연결시키는 데 실패했다. 때문에 망조든 동아일보엔 훌륭한 레거시를 재해석할 인재 자체가 없으니 영락없는 2.5류 신문이다. 앞으로 회생도 어렵다.
어쨌거나 그런 초라한 몰골의 조·중·동에 남은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중·동은 윤통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기 대선을 통해 내각제 개헌으로 정치권과 함께 기득권을 공유하길 원한다. 그게 저들의 더러운 속내다. 바로 그런 이유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언론의 난을 일으켰고, 지금 제2차 언론의 난을 일으켰다. 그때도, 지금도 절독(絶讀) 운동이 일어나 각각 독자 수십만이 떨어져 나갔지만 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얘기를 마저 하자. 중앙이 홍석현 리스크로 망조 들고 동아가 호남 정서 때문에 작살이 났다면 조선은 대체 왜 그런가. 한마디로 좌파 권력, 특히 정치인 김대중과 뒷거래를 하다가 저 지경이 됐다. 조선일보는 1990년대 말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인맥을 대거 편집국 수뇌부로 등용시켰던 게 화근이다. 강천석·송희영을 편집국장으로 잇달아 임명한 것이다.
그들 대부분이 광주일고 출신이었다. 이후 정치인 김대중 비판도 자제하는 등 이미 조선일보는 예전의 신문이 아니었다. 그 회사의 논설고문 김대중 같은 사람은 거기에 얹혀 사는 얼간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던 조·중·동이 요즘 세상 눈치 보며 논조를 바꾸고 있다는 게 거듭 흥미롭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포함한 조·중·동의 한계는 뚜렷하다. 쉽게 말하자. 저들 싸구려 신문은 지난 수개월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광화문 애국운동의 웅장한 모습을 지면에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걸 두고 극우 세력이라며 백안시 내지 축소 보도로 일관해 왔다. 그건 신문이길 포기한 꼴이었다. 곧 거꾸러질 그들의 운명이 가소롭다. 잘가라, 조·중·동!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