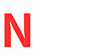한겨울 추위가 매섭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경험해 본 건 지난날 북한·중국 국경에 설 때마다였다. 압록강 칼바람은 온몸을 휘감았고 세차게 몰아치며 뼛속 마디마디 스미는 한파는 세상을 얼음으로 만들어 버렸다. 두꺼운 방한복을 껴입고 핫팩을 몇 개씩이나 주머니에 넣어도 추위를 막아 낼 요량이 없었다.
그때 문득, 얼어붙은 압록강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다. 동토의 땅, 조국의 반쪽 사람들은 추위 앞에 무기력했다. 난방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에서 영하 30도의 한겨울을 지낸다는 건 그야말로 곤욕이었다.
추위는 고통이라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중국과 북한을 가르는 강물은 차디찬 얼음으로 덮였고, 누군가 그 길을 지나간 듯 하얀 눈발 위로 발자국이 선명했다. 분명 그곳에 경계는 있는 듯 없었다. 감시초소에서 잠시나마 따스한 오후의 볕을 쬐는 감시병들의 눈은 스르르 내려앉았고, 무엇을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세월만 보내는 듯했다.
새벽녘의 압록강은 더욱 잔인했다. 안개가 몽실몽실 피어나고 눈꽃이 강물을 휘감았지만 결코 아름다운 풍경이라 느낄 수 없었다. 지난밤에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 추위 속에서 죽어 갔을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바스락거렸다.
양강도 혜산시가 바라보이는 언저리에서 조국의 반쪽 땅을 바라보는 건 더없이 슬픈 일이었다. 분명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 터인데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유령 도시에 다름 없었다.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따스한 온기가 온 집안을 감싸고, 수도꼭지만 돌리면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그곳 사람들에게는 평생 가져야 할 꿈이었다.
왜 그리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앞섰다. 얼어붙은 강물을 녹이는 건, 따사로운 햇살과 바람이려니, 저 동토의 땅 북녘에도 자유의 온기가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그 온기가 되고자 했다. 북녘의 사람들을 깨우는 건 바로 우리의 따스한 관심과 동포애다. 분단 80년이 되는 2025년, 통일의 온기가 북녘 동포들에게 가 닿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