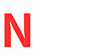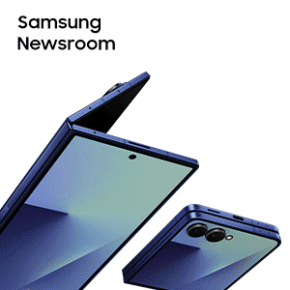압록강에 몸을 반쯤 담그고 종일 허리 굽혀 일하던 여인이 잠시 강변에 앉아 숨을 고른다.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에 사는 북한 주민에겐 그나마 강이 생존의 터가 된다. 이 여성도 하루 종일 강에서 무언가를 잡고 있었다. 일하는 엄마를 두고 물 밖에는 아이가 남겨졌다. 홀로 둔 아이를 잠깐이라도 안아 보고픈 어미의 마음이었을까.
한참을 일하던 여성이 그제야 강 밖으로 몸을 내민다. 누더기처럼 걸친 옷가지만 보더라도 제법 쌀쌀한 날씨임을 알 수 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잠시 몸을 말리며 살림살이도 널어놓았다. 아이를 안아 보는 어미의 사랑이 안쓰럽다. 여성이 입은 옷과 검게 그을린 얼굴만 보더라도 북녘 주민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건 사진을 찍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확대해서 보니 널린 빨래 더미 사이로 ‘요소 비료’라 쓰인 비닐포대 하나가 보인다. 비닐 한 자락도 쉬이 버리지 못하고 긴요하게 써야 하는 북녘 사람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온다.
21세기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넘쳐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비료 포대 한 장을 널어서 새로 써야만 하는 현실을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하루하루를 견뎌 내며 시리고 가녀린 삶을 이어 가는 압록강변의 사람들을 그저 바라본다.
빨갛게 상기된 아이의 두 볼과 애처로운 눈망울이 자꾸만 뇌리에 맴돈다. 분단의 서글픈 잔상이라 해야 할까. 어미의 소원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아니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어미 된 마음에 단 한 가지 소원만이 담겼으리라.
무엇보다 내 아이가 조금 더 따스하기를, 배불리 먹기를, 홀로 남겨지지 않기를…. 오직 하루하루를 살아 내고 있는 그들에겐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그 현실이 더욱 절박하게 다가왔으리라. 강변 너머로 두 모자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필자의 현실 또한 아프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들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분단의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경계였다. 압록강 너머의 사람들에게 제발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후원하기